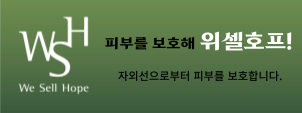2025-07-03 17:19:08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전장유전체분석(WGS)을 포함한 통합적 유전자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인 난청 돌연변이 발견에 성공, 한국인 난청 유전자 지도를 구축하며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연구는 감각신경성 난청(SNHL)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고, 기존 검사로는 찾지 못했던 변이들을 추가로 발견해 진단율을 크게 높였다. 연구 결과는 Cell의 자매지인 의학 연구·실험 분야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되며, 특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원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동안 난청의 유전적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기존의 타겟패널검사나 전장엑솜검사만으로는 약 50%의 환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병원 소아이비인후과 이상연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교수·이승복 교수, 이노크라스 고준영 박사, 스탠포드대 유전체연구실 박성열 박사로 구성된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및 인공와우센터 난청 환자 394 가계(752명)를 대상으로 정밀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단계별 유전자 검사 접근법을 도입했다. GJB2와 같은 주요 유전자는 단일 유전자 PCR 검사로 확인하고, 이후 타겟패널검사(TPS)와 전장엑솜검사(WES)로 더 넓은 범위의 유전자를 분석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전장유전체분석(WGS)**을 활용하여 기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구조적 변이와 딥인트론 변이(비코딩 영역 변이)**를 식별했다.
이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연구팀은 감각신경성 난청 394 가계 중 219 가계에서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기존 정밀 검사 방법(TPS, WES)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변이들을 19.2%(44 가계) 추가로 발견하여, 유전성 난청의 진단율을 약 20%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장유전체분석이 기존 검사로 놓친 변이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전체 진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딥인트론 변이와 같은 비코딩 영역 변이와 구조적 변이를 최초로 확인했다. 딥인트론 변이는 유전자 내에서 단백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엑손과 인트론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비코딩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이로,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 발견은 난청의 유전적 원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어셔증후군의 대표적 유전자인 USH2A 유전자에서 발견된 3개의 새로운 딥인트론 변이는 스플라이싱 오류를 일으켜 단백질 생산에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딥인트론 변이를 표적하는 RNA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난청 유전자 지도를 제시하며, 전장유전체분석이 난청의 유전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한국인에서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들의 구체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유전형-표현형 분석을 통해 난청의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는 향후 유전자 기반의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연 교수(소아이비인후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미진단 난청 환자들의 원인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발견했다"며, "향후 소아 난청의 정밀한 치료 연계를 위해 전장유전체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청의 미진단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추천: 0
추천: 0
- 1운동은 치료이며, 일상 회복의 기술이다 '이태운 운동센터‘
- 2대한방문재활산업협회,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 성료
- 3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 4재활과 운동의 통합, 새로운 회복의 길 '뉴힐링라이프 재활운동센터'
- 5의료 전문 뉴스 플랫폼 ‘의료소비자신문’ 창간… 여의도서 출범식 개최
- 6대한약사회, 한약사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질의서 제출
- 7K-의료AI,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학술적 성과 입증
- 8식약처, '2025년 식의약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식품 매장 맞춤형 AI 안전 점검 솔루션' 최우수상 수상
- 9한의약진흥원, 중앙아시아 3개국 대상 한의약 정책 연수 개최
- 10광주 서구, 주민 건강 증진 위한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